[프랑스] 유럽 치유 농업과 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 동향
[지구촌 리포트]
▶ 치유 농업이란?
치유 농업이란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돌보는 것을 말한다. 의미 또는 활동 범위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치유 농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는 돌봄 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 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이라고도 불린다. 유럽 중세 이전부터 존재하던 치유 농업은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치유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경제 및 사회기능이 약화된 농업계·농촌의 현실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촌 개발을 목표로 나타나게 된 농업방식이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 개발 등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 아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및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제2위의 농산업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 또한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의 95%가 과학 기술이고, 나머지는 5%만이 노동력이라고 할 만큼 첨단화된 농업을 자랑한다. 네덜란드는 ICT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술력과 치유 농업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300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신질환자, 10대 청소년,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 농업을 일구어가고 있다. 이들이 기른 농작물은 파머스마켓이라고 하는 직거래 농산물 센터에서 판매 되기도 하고, 인구가 부족한 농촌 지역사회와 농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순환 경제가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치유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농지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인 셈이다. 네덜란드의 Eekhoeve 치유농장의 경우 연간 약 6억원(5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유농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치유농장 80% 정도는 케어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이며, 나머지 20% 정도는 농작물 생산 판매 및 기타 수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케어팜 서비스는 장애인, 약물 중독자,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격리되지 않고 일상적인 농업 관련 활동을 통해 신체 및 정신적 웰빙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도심형 치유농장의 경우 케어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과 기타 수익의 비중이 5:5 정도로 기타 수익에는 농작물 판매 수익, 레스토랑 또는 카페 운영 수익, 회의장 임대 수익 등 치유농장 서비스 외에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다기능 농업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직거래 역사는 다른 유럽국보다 짧은 편이나 지속가능한 유통구조의 대안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시골 친구(The Friends of countryside)로 약 1,500개의 네덜란드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 네트워크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 농장 직판매장을 운영하는 70여 개의 농가는 농촌 판매점(Landwinkel)이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회원 농가들의 위치와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우그스트(Oogst) 시장은 로테르담시의 시장 허가증을 보유한 농부 시장으로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도심 50km 반경 안에서 재배하고 가공된 음식을 거래하고 있다. 우그스트 시장의 공동창립자인 게르다 지줄스트라(Gerda Zijlstra)연간 400만 유로 (한화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와 농장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방법, 환경, 유기농업의 특성과 품질과 맛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생산자는 제철 농산물의 판매와 소득 측면에서 유리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그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2008년에 설립된 12헥타르 규모의 Future Roots 농장은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치유농장이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있어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행동 및 정서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학교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을 이 농장의 프로그램에 보내는 체계적인 의뢰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치유 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젊은 세대는 목축업, 작물 생산, 삼림관리 등의 농업 관련 기술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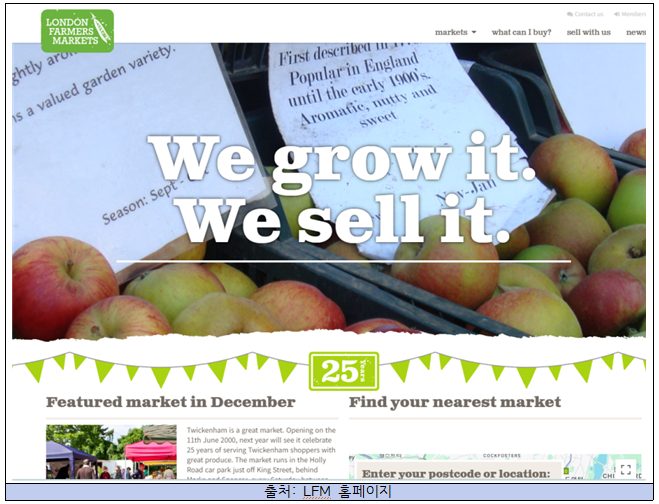
또한, 런던에서 열리는 농부장터인 LFM(London Farmers’s Markets)은 영국 전체에서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나믹 유기농재배와 유사한 방법의 대체 유기농업, 스스로 자생이 가능한 토양으로 친환경 비료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재배 방식 그대로의 규칙을 따르는 유기농업이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품은 런던 지역에서 100마일(160km) 이내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마켓은 직접 키우거나, 수집하거나, 요리한 것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생산자를 대신해 물건을 팔 수 없는 것이 규율이다. 1999년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런던 로컬 지역 기반으로 보증책임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장터이다. 해당 장터는 유기농산물의 유통 비용을 낮추고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농부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리마켓와 같은 농산물 꾸러미 선주문 및 거점 수령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탈리아와 프랑스

치유 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에 의해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 집단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부분은 주로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통적인 가족농과 민간 건강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탈리아 농업에서는 가족농의 99.23%가 다기능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기능 농업이란 기존 생산 위주의 농업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농업 영역을 창출, 더 높은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80% 이상이 생산 중심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줄하는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 농가 소득에는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접 판매, 복합활동으로 제안된 새로운 재접지(식물원,공원, 농업관광)등이 포함되어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위치한 목장인 Tardeli은 버려진 목초지를 재건하여 농업 관광 수입을 중가시키고 동물복지 등을 개선하였다. 농장 경관을 새롭게 정리하고 농업 관광 활동과 연계한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하여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적 자원이 창출되며, 농촌 경관이 개선되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이 생산되었으며, 새로운 고정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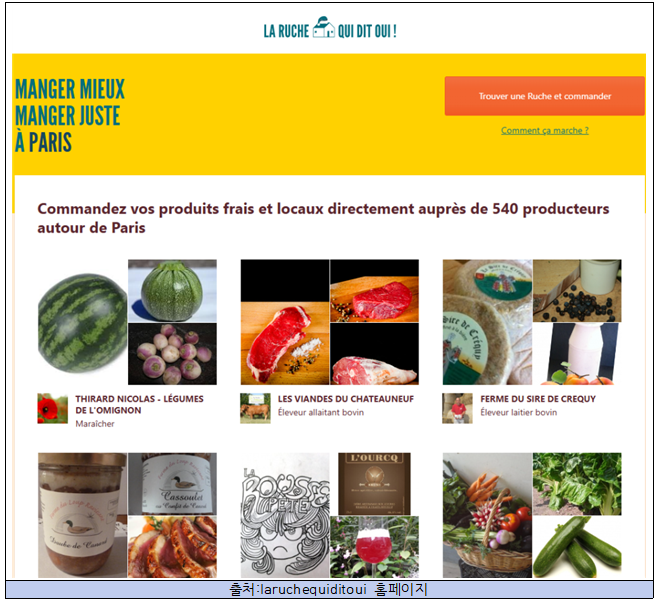
프랑스의 농산물 직거래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오면서 접근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직거래 형태가 생겨났다. 최근에는 공간적인 거리의 개념을 넘어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친밀성을 높이는 방식이 주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농부장터, 소비지역 농산물 아웃렛, 농산물 직판장 등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참여의 확대로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방식과 공동체 지원 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1년 설립된 푸드 어셈블리가 있다. 푸드 어셈블리의 프랑스 명은 라뤼슈퀴디위(La ruche qui dit oui)로 지역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라뤼슈(La ruche)는 벌집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푸드 어셈블리 내에서 생성된 지역시장을 뤼슈(ruche)라고 부른다. 사용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 근방의 뤼슈를 찾고 뉴스레터에 가입하면 해당 지역의 매니저가 매주 어떤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농산품을 선구매하면, 뤼슈가 개최되는 날 직접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역 농부는 자신이 준비해 온 농산물의 평균 80%를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하고 시장에 오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잉여 농산물의 양이 줄어든다. 또 이들은 제품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모든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며,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의 원산지 거리가 표시되어있다. 소비자들은 구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구하지 못했던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는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총 8개국에 진출해 있고, 매주 유럽 전역의 1200여 개 공동체에서 8,000명 이상의 생산자와 17만 명 가까이 되는 유럽의 소비자들을 잇는 지속 가능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구조의 직거래 형태이다.
▶ 시사점
유럽 연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ESG를 실천하는 것은 국가, 기업, 사회,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제품의 소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생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감 있는 제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치유 농업 또한 지속가능한 식품 트렌드의 일환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미 우리 농식품의 특징인 ‘채식, 건강식, 친환경’적인 부분과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요소를 더해 강조하고, 친환경에 한층 다가간 건강한 식품으로 수출 및 홍보 방안을 확보한다면 한국의 농식품의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https://theconversation.com/how-farms-can-help-improve-the-lives-of-disadvantaged-young-people-97887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유럽 , 아프리카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 식품 첨가물 규정 동향 (0) | 2025.02.20 |
|---|---|
| [독일] 독일 냉동식품 시장동향 (2) | 2025.02.15 |
| [유럽] 무알콜 음료 및 주류 시장 동향 (0) | 2025.02.14 |
| [유럽] 유럽 위원회, 최신 EU 농업전망보고 – 농업시장 전망 (0) | 2025.02.14 |
| 맥주의 성지 벨기에에서 무알코올이 인기? (0) | 2025.02.06 |